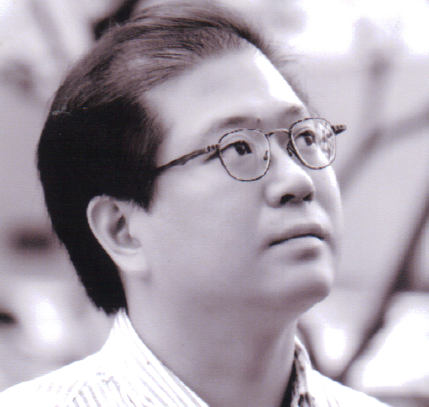[투모로우 에세이] 대한민국 오페라의 부흥을 응원합니다
2015/10/01

박제성 음악평론가
모든 장르 예술의 집약체, 오페라
17세기에 탄생한 오페라는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며 문화에서의 독보적 지위를 점유해나갔다. 몬테베르디(Monteverdi, 1567~1643)와 글루크(Gluck, 1714~1787), 모차르트(Mozart, 1756~1791)로 이어지며 발전을 거듭한 오페라는 “말이 먼저인가, 음악이 먼저인가?”란 명제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며 대본의 문학성과 음악의 표현성을 향상시켰다. 베르디(Verdi, 1813~1901)와 바그너(Wagner, 1813~1883)를 통해 오케스트라와 극 형식 부문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뒀고, 푸치니(Puccini, 1858~1924)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Strauss, Richard Georg, 1864~1949)를 거치며 “문학과 음악은 더 이상 두 개가 아니”란 사실을 각인시켰다. 20세기 작곡가들에게 오페라는 명실상부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적 실험과 종합의 총아’였다.

20세기 이후 오페라 연출에서도 연극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화 감독과 대규모 공연 기획자들까지 가세하며 모든 장르의 예술이 오페라로 집약됐다. 최근엔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와 카렐 아펠(Karel Appel, 1921~2006),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 1955~) 같은 현대 미술의 거장은 물론이고 내로라하는 패션 디자이너들까지 오페라 무대미술과 의상을 담당하며 오페라 하우스를 ‘제2의 갤러리’ 삼아 자신의 예술 세계를 자유롭게 펼쳤다. 이렇게 봤을 때 오페라는 단연 문화의 정수(精髓)이자 특정 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상연작은 ‘라 트라비아타’
기록이 남아 있는 한국 최초 오페라 공연은 1937년 부민관(현재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상연된 푸치니 작품 ‘나비부인’이었다. 하지만 이 무대는 일본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어서 사실상 첫 공연은 광복 후인 1948년 조선오페라협회가 국립극장에서 선보인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였다. 이후 1957년 서울오페라단, 1962년 국립오페라단이 각각 창단되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두 단체는 이후 수많은 작품을 상연하며 오늘날까지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사설 오페라단의 활약도 눈부셨다. 1968년 김자경오페라단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사설 오페라단이 활동하며 국립∙시립오페라단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손꼽히는 오페라 무대는 한동안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 서울 소재 극장 두 곳이었다. 이후 1993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며 한국은 최초로 전문 오페라 하우스를 보유하게 됐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오페라 문화’의 태동은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경기도에도 성남시와 고양시에 각각 복합예술단지가 조성되며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섰다. 가장 최근 독립 오페라 하우스가 설립된 도시는 대구. 부산과 인천에서도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인프라 팽창에 발맞춰 성악가들의 자질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카라얀(Karajan, 1908~1989)에게 발탁된 조수미, ‘메트 오페라(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서 상연되는 오페라)의 스타’ 홍혜경과 같은 소프라노가 대표적. 여기에 강병운과 연광철, 아틸라 전(이상 베이스), 사무엘 윤(베이스 바리톤) 등의 저음 가수들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Bayreuth Festival, 매년 여름 독일 바이에른 바이로이트에서 개최되는 오페라 축제)과 유럽 오페라 무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활동 중이다. 김우경과 강요셉, 김재형(이상 테너), 임선혜, 캐슬린 킴, 황수미(이상 소프라노) 등도 세계 오페라계의 찬사를 받으며 저마다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다만 오페라 지휘 부문에선 정명훈 이후 이렇다 할 후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다소 안타깝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전적으로 기업의 예술적 지원이 절실하다.)
시스템∙인력∙자본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 오페라계가 ‘남부러울 것 없이 발전을 거듭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 모습만 보면 몹시 불균형하다 못해 위태롭기까지 해 우려를 자아낸다. 오페라는 뭐니 뭐니 해도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시즌제 운영 시스템’과 ‘스타 중심의 상업적 흥행력’을 두루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국내 오페라는 전속 오케스트라도, 상임 지휘자도, 전문 예술감독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한 도시(혹은 나라)의 문화적 상징으로까지의 발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연출과 무대 전반을 둘러봐도 전문성과 에술성을 겸비한 해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연히 종합예술다운 ‘장르 간 교집합 창출’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오페라단이 턱없이 적은 인원과 최소한의 지원, 글로벌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들로 운영되다보니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 데 급급할 뿐 거장급 예술가를 섭외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경험이 적거나 아예 없는 국내 신인 음악가 기용은 흥행 실패로 이어지기 일쑤다. 사정이 이러니 세계적 오페라 하우스들과 기량을 겨루는 일은 요원하다. 그 결과, 한국 오페라는 극장(과 국가)의 예술적 미래에 대한 비전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오페라 하우스 시스템 못지않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금 부족’이다. 전문 예술가의 개런티와 무대 제작비는 말할 것도 없고 높은 저작권료와 악보 대여 비용 탓에 어지간한 근현대 오페라는 무대에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전문가 기용 자체가 막혀 있으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수립이나 지휘자 양성, 성악가 관리, 다양한 연출 실험과 예술성 높은 무대 제작 등의 가능성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한 번 상연된 작품은 재상영 기회를 잡기 어렵고 변변한 창고 시설조차 없어 막대한 비용을 들인 무대가 한 차례 공연 직후 폐기 처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총체적 난국이다.
경쟁력 갖추려면 민간 자본 도입 ‘절실’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문화 장르’다. 그런 만큼 예부터 귀족이나 사업가의 후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실제로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수많은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고 운영해온 유럽 왕족들과 민간 자본, 이를테면 △글라인드본(Glyndebourne) 지주 가문(영국) △철도왕 사바 마몬토프(Savva Mamontov, 러시아) △바이로이트 귀족 가문(독일) 등은 오페라를 해당 국가의 대표적 예술 장르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후발주자인 아시아에서도 신국립극장(일본)과 국가대극원(중국) 등 국가 중심 지원이 이뤄지며 유럽과 견줄 만한 오페라 시스템이 속속 갖춰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급 문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만큼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절실하다. 차원 높은 문화 상품이 국가적 경쟁력으로 도약할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오페라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성악가∙오케스트라∙지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휘자와 연출가, 그 밖의 무대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국내 오페라 업계는 다시 일어설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회화와 연극, 패션, 기업 홍보와 관광 산업, 디지털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문화의 꽃’ 오페라 부흥 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이 칼럼은 전문가 필진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