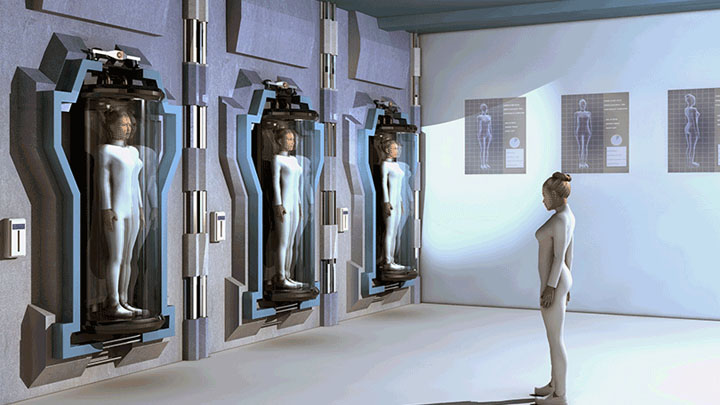‘104세 자결’ 구달 박사가 남긴 질문
2018/06/21
![]()

알래스카는 자연산 연어로 유명하다. 그곳 남동부 항구도시 발데즈의 연어 부화장을 가서 본 적이 있다. 아시다시피 연어는 민물에서 나고 바다로 나가 성장한 후 산란기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산란지를 찾기 위해 수로를 따라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몸짓은 치열하다. 자칫 사냥 나온 곰의 끼니가 되기 쉽고, 몸싸움 끝에 뭍으로 밀려나면 갈매기 밥이 되기도 한다. 수면 위로 펄떡이는 놈이나 강변에서 헐떡이는 녀석을 보노라면 그 삶의 무게에 만감이 교차한다.

산란 끝낸 알래스카 연어의 운명
노벨상 수상 미국 생물학자 조지 월드[1]의 강연록을 보면 생물학적 삶과 죽음의 의미가 나온다. 생명의 순환에서 보자면 죽음은 삶과 짝을 이루는 통과의례다. 아메바는 죽음을 모른다. 단세포는 끊임없는 분열로 자기 복제본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불멸이다. 하지만 생명은 새로운 재생산 방식을 만들어냈다. 유성생식이다. 유성생식을 하는 모든 유기체는 단세포(수정란)에서 생식세포와 체세포로 분화한다. 생식세포는 자기증식으로 불멸을 이어가지만 체세포(그 합이 몸이다)는 생식세포의 충실한 운반체가 된다. 반대편 생식세포(난자 혹은 정자)와의 만남이 성사되면 임무를 마치고 퇴장한다. 우린 그걸 ‘죽음’이라 부른다.

앞서 말한 알래스카 연어만 해도 새 생명을 위한 산란의 여정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연어가 산란지로 회귀할 때엔 소화기관마저 퇴화한다. 산란을 마친 성어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기능적으론 막바지다. 이 시기엔 식도로 먹이를 밀어 넣어도 소화를 못 시킨다. 임무를 완수한 신체에게 생명은 작별을 고한다.

장어도 마찬가지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주와 유럽 해안의 장어는 산란기가 되면 사르가소[2]의 심해로 모여든다. 산란을 마친 성어는 사멸하고 어린 장어는 홀로 고향 바다로 향한다. 미주 장어는 미주로, 유럽 장어는 반대편으로 가는데 헷갈리는 법이 없다. 어린 녀석들이 초행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진 수수께끼다.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3]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새끼 장어들이 언제나 완벽하게 길을 찾아가는 건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자유와 자율, 창조와 방황의 의미를 꿰뚫는 절묘한 해석 아닌가.
“내일 삶을 끝낼 수 있어 기쁘다”

얼마 전 죽음에 관한 뉴스가 있었다. 특이했다.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 박사 얘기다. 자결(自決)을 발표하고 실행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세계 언론을 탔다. 104세에 이르러 스스로 존엄사를 결행한 그는 마지막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내일 삶을 끝낼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고 했다.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스스로 약물 밸브를 열어 생의 출구로 의연히 퇴장했다.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시기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속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곧잘 해도, 마지못해 호흡기를 떼는 일은 있어도, 죽음을 함께 자축할 순 없었다. 구달 박사는 이런 통념에 금을 내고 떠났다. 연명이 무의미한 삶을 왜 이어가야 하는가. 그는 홀가분하게 떠났지만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가볍지 않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스티븐 핑커[4]의 신간 ‘지금, 계몽주의(Enlightenment Now)’엔 이런 일화가 나온다. 그가 대학에서 강연할 때의 일이다. 인지과학자인 그가 “인간의 정신적 삶은 뇌세포 활동 유형(pattern)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특별히 자살 의사가 비치거나 냉소적인 투의 질문이 아니었다. 이 책에서 핑커는 “불멸의 영혼에 관한 전통적·종교적 믿음이 과학으로 전복되고 난 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된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진지한 의문”이라고 썼다. 그의 책은 여학생의 질문에 대한 필사적 답변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는 책에서 계몽주의의 유산인 이성·과학·휴머니즘·진보를 강력히 변론한다. 성공했을까. 평은 지금까지도 엇갈린다.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래, 풍요롭게 사는 게 전부일까?
오늘날 첨단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적어도 많은 이가 그렇다고들 한다. 104년을 살다 간 구달 박사도 그 덕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길어진 삶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물음 또한 절박해지고 있다. 많은 게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왜 굳이 그걸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도 늘고 있다.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체성 문제가 뜨거운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것 역시 (오랜 차별과 불평등 문제 외에도)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깊은 욕구와 관련 있어 보인다.

한나 아렌트[5]는 일찍이 자신의 책 ‘인간의 조건’(1958)에서 현대 사회를 두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생산 과정을 절대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오히려 시작과 끝, 자신의 용어로 ‘탄생성(natality)’과 ‘필멸성(mortality)’에서 찾았다. 인간 개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불멸의 업적이나 흔적을 남김으로써 불멸성을 얻고 자신의 ‘신(神)적 본성’을 증명해 보이려 한단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2005년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 얘기로 요약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를 죽음에 할애했다. “우리 모두 언젠간 죽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죠. 삶이 만든 최고 작품이 죽음이니까요.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죽음 덕분에 새것이 헌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로움’이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중략)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그마에 잡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세요. 타인의 잡음이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마음과 영감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 생각해야 할 것

당시 그는 췌장암을 앓고 있었다. 그로부터 6년 후 눈을 감았고 같은 달 자신의 이름을 딴 900쪽짜리 평전으로 환생했다. 책엔 그가 직접 쓴 마지막 글도 실렸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인류에게 무언가 기여하기를, 그런 흐름에 무언가 추가하기를 바란다. 이것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전 시대에 이뤄진 모든 기여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흐름에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나를 이끌어준 원동력이다.”
56세에 마감한, 준비된 죽음이었다.
※이 칼럼은 해당 필진의 개인적 소견이며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1] George Wald(1906~1997). 망막 내 단백질 로돕신 연구로 1967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공동 수상)
[2] Sargasso. 북대서양의 미국 바하마제도 동쪽 앞바다. 모자반류(Sargassum natans)가 풍부하다고 해 붙여진 명칭이다
[3] Niels Bohr(1885~1962). 원자 구조 이해와 양자역학 성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22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4] Steven Pinker. 미국 심리학자 겸 대학(하버드대) 교수. 1998년과 2003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5] Hannah Arendt(1906~1975).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