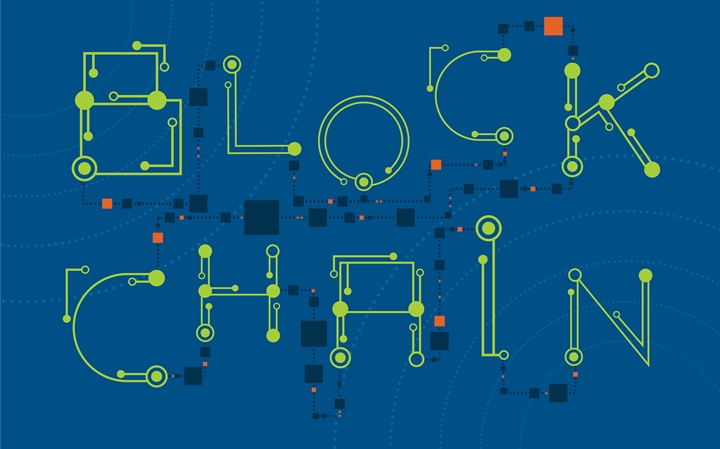웹 전성시대, 저널리즘은 지각 변동 중!
2017/06/28
![]()


지난달 17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블로그에 올라온 이 글은 전 세계적으로 적잖은 화제를 낳았다. 그도 그럴 것이 워싱턴포스트는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내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일간지이기 때문. 그런 신문이 자사가 직접 운영하지도 않는 독립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사를 유통하겠다, 고 선언한 것이다.
페이퍼 저널리즘, ‘닷컴’ 서비스에 눈뜨기까지

따지고 보면 저널리즘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퍼스널 컴퓨터(PC)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이미 상당수의 컴퓨터 서비스 업체가 신문∙방송 등 주요 뉴스 매체와 손잡고 PC 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컴퓨서브(CompuServe)[1] △프로디지(Prodigy)[2] △AOL(America OnLine)[3] 등이 각종 뉴스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제공했으며 얼마 후 국내에서도 하이텔[4]∙천리안[5] 등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본격적인 웹(web) 시대는 1990년대 들어 인터넷이 보급되고 1995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이 확대되며 막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는 자연스레 온라인 콘텐츠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흐름을 타고 한편에선 인터넷 전용 뉴스 대행사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출현엔 사옥과 윤전기, 보급소 등 어떤 것도 필요 없었다. 뉴스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기사화해 온라인에 업로드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됐다. 이후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도 다양한 언론사 뉴스를 편집해 올리기 시작했다. 구글은 아예 ‘선호도에 따라 자동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탑재,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공급하고 나섰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흐름이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당연히 기존 매체들이었다. 실제로 세기 말 직전 유행했던 미래 예측론 중에서도 ‘페이퍼 저널리즘(paper journalism)’은 ‘21세기에 사라질 직업’ 목록의 최상단을 장식하곤 했다. 20세기 후반, 그야말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둘렀던 주류 신문사와 방송사는 일약 “급변하는 뉴스 생태계에서 변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가 앞다퉈 사내에 디지털 뉴스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가는 곳 몇몇은 아예 매체명에 ‘닷컴(.com)’을 붙여 별도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곳에선 ‘디지털뉴스팀’을 따로 두고 운영했다.

2000년대를 지나오며 변화의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웹 2.0 등 날로 새로워지는 기술로 인해 온라인 교류 시스템은 점차 개방되고 있으며, 연결성(connectivity)도 강해지는 추세다. PC를 넘어 모바일 기기로 보급이 확산되며 사용자 층도 계속해서 늘었다. 뉴스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변화는 뉴스의 생산∙유통이 더 이상 특정 중심(center)에서 이뤄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 간 연결을 매개로 확산되는 걸 의미한다. 그 결과, 소비자는 ‘보다 참여적이며 이용자 중심적인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술적 기반은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했다. 기존 매체 역시 그에 걸맞은 변신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어쩌다 레딧과 손 잡았을까?
‘미국 최고 일간지(워싱턴포스트)’가 ‘온라인 뉴스 전문 커뮤니티(레딧) 사용자 중 하나’로 자신의 위상을 낮춘 사건이 의미심장한 건 이 같은 흐름 때문이다. 지금껏 주류 뉴스 에이전시 중 어느 곳도 온라인 영역조차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 별도 전문 포털의 힘을 빌리려 한 적이 없었던 것. 특유의 자신감 내지 자존감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현실은 엄연히 현실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고 호황을 누리던 1993년 당시 매일 120만 부 가까이 팔려나갔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판매 부수가 줄어 2015년엔 40만 부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레딧은 올 들어 월 평균 5억4200만에 이르는 방문자 수를 기록 중이다. 물론 그중 워싱턴포스트 페이지를 열어보는 사람 수는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일단 접근성 측면에서만 봐도 차원이 다른 규모를 자랑한다.

사실 새로운 웹 환경에 대응하려면 회사 내에 별도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기보다 이전부터 제공돼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2013년 파산 위기에 직면한 워싱턴포스트를 2억5000만 달러(약 2조850억 원)에 인수한 이는 제프 베조스(Jeffrey Preston Bezos)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였다. 온라인 생태계의 특성에 누구보다 정통한 그인 만큼 워싱턴포스트 인력의 뉴스 생산 능력과 명성을 온라인의 잠재력과 효율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지난 세기, 명성을 누렸던 언론사가 이처럼 눈에 띄는 결단을 내리는 사례는 최근 속속 생겨나고 있다. 1986년 창립,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경제 동향에 초점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영국 조간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지난해 3월 종이 신문을 완전히 폐간하고 온라인 버전만 운영하기로 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사 주간지 ‘타임(Time)’ 역시 지난달 13일 디지털 뉴스 시대를 맞아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전체 직원의 4%(약 300명)를 감원하는 한편, 동영상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판매 인력 채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와 동시에 신규 디지털 매체 ‘엑스트라 크리스피 (Extra Crispy)’를 출범하며 “올 한 해 5만 건 이상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1500시간 이상의 생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월스트리스저널(Wall Street Journal)이나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같은 전통 잡지 업계 강자 역시 바이아웃(buy-out, 특정 기업 지분의 상당 부분 혹은 기업 자체를 인수한 후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인원을 감축하며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중심 축을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25세 미만 모바일 뉴스 소비자’에 주목하라

미디어 업계가 이 같은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배경엔 뉴스 소비 행태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소비자의 뉴스 소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꽤 유의미한 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됐다. 싱크탱크(think tank) 대신 ‘팩트탱크(fact tank)’란 용어를 유행시킨 미국 민간 연구 단체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내놓은 보고서 ‘현대 뉴스 소비자(The Modern News Consumer)’가 그것. 대략적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이가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바일 등 일상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뉴스를 소비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아마존이 인수한 워싱턴포스트 정도라면 자체 디지털 뉴스팀이나 닷컴 형태의 온라인 신문사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도 드러났듯 급변하는 뉴스 소비 문화에서 젊은이에게 접근하려면 과거 대단했던 언론사 간판을 앞세우기보다 많은 사람이 맘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워싱턴포스트가 레딧의 문을 두드린 덴 이런 판단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미디어 혁명도 전제는 ‘기술’… 변화 앞장서야
딱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기독교의 중요한 축일 중 하나인 만성절(All Saints Day) 전야. 검은 두건이 달린 외투를 뒤집어 쓴,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독일 동부 소도시 비텐베르크(Wittenberg) 성문에 큰 종이 한 장을 붙이고 있었다. 종이에 적힌 건 일명 ‘95개조 반박문’. 당시 국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던 교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사내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훗날 종교 개혁의 불씨를 댕긴 주인공이었다.
현대 역사 교과서는 이날 루터가 손수 못 박은 이 반박문이 종교 개혁의 결정적 계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루터와 그의 동료들이 도시 곳곳에 뿌린 반박문은 도합 6000부였다. 앞서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가 유럽 전역에 보급한 인쇄술로 상당한 분량의 글도 여러 장 복사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따지고 보면 루터의 반박문이 유럽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기술’이었던 셈이다.

사용자의 시선을 붙드는, 잘 설계된 콘텐츠라면 단 며칠 새 수 백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릴 수도 있는 세상이다. 이 같은 ‘콘텐츠 전파 원리’는 루터가 활약했던 16세기에도, 인터넷 미디어가 득세하는 21세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요(要)는 “최대한 많은 이가 봤으면 하는 핵심 콘텐츠는 당대 기준으로 최신 기술을 동원해 전파하게 마련”이란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가 자체 시장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입각해 전략을 수립, 끊임없이 변신을 꾀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환경 급변기엔 변화의 방향을 면밀하게 읽고 그에 맞춰 변화를 선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