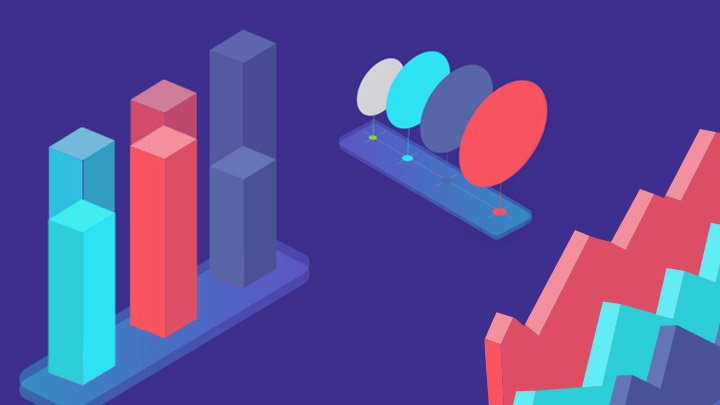대기업 엔지니어 재교육, 15년간 맡아보니
2018/05/03
![]()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대졸 공채(公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래가 적어도 50년은 됐는데 요즘 들어 부쩍 ‘이제 그 효용이 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배달직 지원자 뽑으며 조리사 자격증 유무 본다?
식당 주인이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심사 기준은 그 종업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주방에서 일할 직원이라면 조리사 자격증 유무가, 배달 직원이라면 운전 경력이 각각 중요한 잣대가 된다. 홀 서빙 직원을 잘 뽑으려면 한 번에 그릇을 몇 개나 나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역할 불문하고 일단 인사(HR) 조직에서 사람들을 왕창 뽑은 후 각 부서에 뿌려준다. 이 과정에서 이를테면 배달직 지원자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수준의,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어렵게 경쟁을 통과한 사람도 본인의 능력이나 희망과는 무관한 부서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진다. 자연히 조기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런 사례가 반복되면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 측 만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공채 제도에선 ‘아무 일이나 시켜도 금방 잘해내는’ 인재의 효용이 크다. 머리 좋고 성실한 사람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기업들은 성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벌과 학점을 들여다봤다. 지능(IQ)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적성검사’란 시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업이 채용 과정서 ‘직무 역량’에 눈 돌리는 이유

최근엔 ‘직무 역량 중심’이란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다. 2015년 삼성전자는 각 부서의 수석급 실무자에게 주요 대학의 전공 이수 체계와 강의계획서를 분석하도록 했다. 개별 교과목이 그들 부서 업무 수행과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를 들면 내가 재직 중인 아주대학교 전기공학과 전공 과목 중 ‘전자기학’이란 게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삼성전자 실무진은 학교 측이 △무슨 책을 교재로 해 강의를 진행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치는지 △그 과목이 자사 특성 부서 업무 수행과 몇 퍼센트나 관련돼있는지 조사했다. 전체 평점을 따지는 대신 △지원 사업부별로 연관성 높은 과목에 가중치를 두고 △고급 선택 과목 이수 여부를 따져 △성적을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로 자동 환산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이듬해인 2016년부터 삼성전자 공채 제도에 본격 적용된 걸로 보인다. 이후 다른 대기업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 유형이 바뀌면서 학생들을 상담할 때 들려주는 얘기도 달라졌다. 예전엔 “무조건 학점이 중요하니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성적부터 관리하라”고, “입사한 후에도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니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두루두루 수강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요즘은 “어렵겠지만 3학년 올라갈 때까진 관심 분야와 지망 기업을 정하고 그에 맞춰 이수 계획을 차별화하라”고, “4학년이 되면 통합 설계 프로젝트 과목을 수강하며 면접 때 쓸 얘깃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사실 무척 어려운 얘기다. 전자공학에 어떤 분야가 있으며, 서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하는 것들은 학부 졸업할 때까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취업 자체를 위해서라면 피상적이더라도 하나를 선택,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답보 상태 기업 경영, ‘채용 혁신’에 길 있을 수도

대졸 공채는 말할 것도 없고 박사급(級) 경력직 채용에서도 인사 조직의 힘이 너무 센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실제로 현업 부서에서 산학 과제 등을 거치며 수 년간 관찰, 역량이 입증된 인재를 뽑으려 해도 인사 조직에서 어깃장을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 걱정스러운 건 그 과정에서 학교 간판 같은 ‘껍데기’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단 사실이다. 현업 부서에서 아무리 항의를 해도, (‘학벌 딸리는 지원자 채용을 몇 건 막느냐’가 실적이 되는 건 아니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사 조직은 요지부동이다. 반면, 미국 기업에서의 채용은 대부분 현업 부서가 주도한다. 인사 조직은 거들 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인사 관리가 직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개인이 받는 보상도 그 직무에 따라 결정된다.

‘현업 부서에 채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얘긴 그리 새롭지 않다. 오래전부터 적잖은 사람들이 주장해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있다가 한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된 사람이 한둘인가? 삼성전자만 해도 임원급으로만 매년 수십 명이 들어온다. 결국 최고위층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물론 기업으로선 그럴듯한 반대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현업 부서에 채용 권한을 주면 온갖 청탁이 빗발칠 것이다” “현행대로 채용 제도를 유지해도 회사가 충분히 잘 돌아간다”….

대기업 엔지니어 재교육 강의를 맡아 진행해온 지 15년이 넘었다. 그런데 요즘 과장∙차장급 엔지니어를 가르쳐보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회사 전체의 전문성은 올라갔는지 몰라도 개개인으로 보면 전혀 아니다. 시스템을 잘 갖춘 덕분인진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업무가 가능하단 게 종종 신기할 지경이다.

기업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지, 혹 채용 제도가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기업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문제다.
※이 칼럼은 해당 필진의 개인적 소견이며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