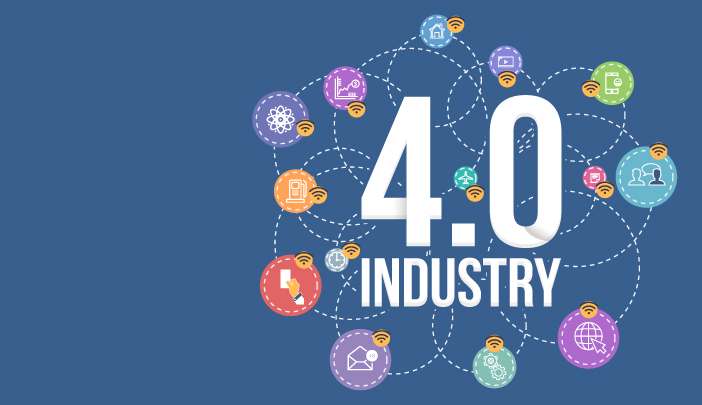디지털 광고 전성기, 기업에 던져진 숙제들
2017/06/08
![]()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이미 6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이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이 수치는 올해 87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전체 광고 시장 규모(187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 수준이지만 “디지털 광고가 머지않아 TV나 빌보드(billboard, 대형 옥외 게시판) 같은 전통적 광고 매체를 뛰어넘을 것”이란 사실을 의심하는 이는 많지 않다.

“적재적소 비용 집행” 광고주 로망 실현시키다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디지털 광고가 전통적 매체에 비해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정확한 사용자 그룹을 겨냥할 수 있다. TV나 빌보드 광고는 광고하려는 브랜드를 최대한 노출시킴으로써 구매를 유도하지만 매체의 특성상 상관 없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걸 피할 수 없다. 광고를 무작위로 노출시키는 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에 비해 디지털 광고는 데이터에 기반, 특정 그룹을 표적으로 삼는 게 가능하다.

그뿐 아니다. 디지털 광고는 (광고를 접한) 사용자가 취하는 행동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단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전통적 매체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클릭처럼 즉각적 반응은 물론, 상품 구매나 회원 가입 등의 구체적 성과도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다. 돈을 허공에 뿌리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하는 광고주 입장에선 이보다 반가운 장점이 없다.

디지털 광고의 역사를 논하려면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해 미국 월간지 ‘와이어드(Wired)’의 온라인 버전이었던 ‘핫와이어드(HotWired)’는 자사 웹사이트에 배너를 하나 올렸다. 그 배너엔 이런 문장이 적혀있었다. “Have you ever clicked your mouse right here? You will(여길 마우스로 클릭해본 적이 있나요? 앞으론 그렇게 될 겁니다).” 웹사이트 일부를 광고에 할당하고 돈을 받는 온라인 광고가 시작된 것이다. ‘온라인 광고의 역사’란 글에 의하면 이 공간을 최초로 구입한 기업은 미국 통신회사 AT&T. 당시 집행된 광고료는 3만 달러였다.

첨단 기술 각축장… 봇∙증강현실 등 속속 도입
배너와 함께 시작된 디지털 광고는 구글이 등장하며 키워드 검색 형태로 발전했다. 이후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폭넓게 사용되면서 사용자 정보와 온라인에서의 행동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광고를 보여주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등장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광고가 쉽게 구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네이티브 광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의 배후엔 ‘데이터’라는 큰 강물이 존재한다.

디지털 광고는 어떤 면에서 월스트리트 금융 거래와 닮았다. 광고가 노출되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supply)하는 매체와 자사 브랜드(혹은 상품) 광고 노출 공간을 필요로(demand) 하는 광고주를 빠르게 연결시켜주는(matchmaking) 과정이 주식 거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애드테크(ad tech) 업계에서 사용되는 기술 역시 월스트리트에서 쓰이는 기술과 비슷하다. 앱넥서스(AppNexus)나 미디어매스(MediaMath), 미디어오션(MediaOcean) 등 크고 작은 애드테크 기업이 미국 뉴욕 맨해튼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터넷 발전을 추동(推動)한 원동력은 포르노와 광고”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핫와이어드 배너 광고 이후 디지털 광고는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돼왔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봇(bot) 기술이나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광고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채팅봇∙사용자 간 대화, 머신러닝 학습 재료로

‘채팅봇(chatting bot)’으로 대표되는 봇 기술은 현대 인공지능의 성과가 집약된 영역이다.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NLP) △감정 인식 등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한데 모여 인간과 기계, 혹은 기계와 기계 간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한 시기가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엔 (인공지능이 장착된) ‘채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봇은 시리(애플)나 엘릭사(아마존)처럼 ‘인간 음성을 알아 듣고 대답하는 기본적 수준의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다. 배너 광고가 막 시작된 1990년대에도 광고주들은 웹사이트 방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검색의 시대엔 사용자가 검색 창에 입력한 단어를 바탕으로 사용자 의도를 분석해야 했다. 실제로 브라우저의 ‘주소’ 란에 특정 도메인을 입력하거나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만으로도 사용자의 의도를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개 분절된 단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채팅)봇의 시대로 접어들며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다. 키워드 검색이 문맥을 상실한 채 한계에 부딪친 것과 달리 봇은 사용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채팅봇, 12시 정각에 점심 먹을 수 있게 준비해줘.” “한식으로 준비할까요?” “아니, 더 간단한 걸로.” “피자를 주문할까요?” “그래.” “그럼 피자헛에서 항상 드시던 페퍼로니 피자를 주문하겠습니다!”

사람과 채팅봇 간의 이 대화에서 ‘피자헛’은 피자를 먹으려는 사용자 등장을 탐지한 광고주들이 실시간으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결과다. 또한 “피자를 주문할까요?” 같은 질문은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처럼 (‘피자 주문’이라는) 광고주의 매출로 이어지는 대화는 데이터로 저장돼 머신러닝의 학습 재료로 활용된다. 이 과정을 거치며 사용자의 의도와 행위를 더 많이 알게 된 인공지능은 한층 정교한 광고를 대화 속에 자연스레 끼워 넣을 수 있게 된다.
성패, ‘엉터리 데이터’와의 싸움 결과에 달렸다

디지털 광고에도 그늘은 있다.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공격적 광고는 말할 것도 없다. 광고주 입장에선 사용자를 흉내 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봇이 만들어내는 엉터리 데이터와의 싸움 역시 고민거리다. 사기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은 바로 그 때문에 애드테크 업계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화두다. 그렇긴 하지만 애드테크는 첨단기술과 창의력이 만나 수익을 창출한단 점에서 무척 흥미로운 영역이다. 정보기술을 보유한 나라 입장에선 이만한 미래 먹거리도 없다. 전 세계에 수많은 디바이스를 깔아놓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특별히 관심 가질 만한 분야이기도 하다.